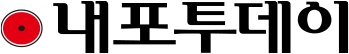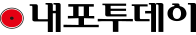청송사주지 범상스님 시인 수필가
‘안녕(安寧)하세요’라는 인사말은 평안을 ‘묻는 것일까’ 아니면 ‘명령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할 때는 묻는 쪽에 가깝고, ‘안녕하세요 ’는 ‘진지 드세요’와 같은 맥락에서 명령어로 들린다. 그런데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현재는 ‘그간의 지내온 과정을 묻는 인사말’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물음의 이면에는 안부를 걱정하는 속 깊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드러난 표현과 행동을 보면 별 생각 없는 습관적 단어로 취급되는 것 같다.
안녕(安寧)이라는 두 글자 모두 ‘편안하다’는 의미로 새긴다. 하지만 살펴보면 안(安)자는 집안에 여성이 고요히 앉아 있음의 표현이고, 녕(寧)은 집안의 탁자[丌]위에 음식그릇[皿]이 있고 그 위에 마음[心]이 올려져있다. 그래서 안(安)은 집안의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화합과 화목의 편안함이라면, 녕(寧)은 곤궁하지 않는 경제적 여유에서 오는 편안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사회는 물질을 나타내는 녕(寧)은 넘치는 반면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야 가능해지는 안(安)은 사라지고 있다. 어른들을 찾아뵙고 이웃을 살펴야 하는 년말연시가 부담가고, 명절은 서로 눈치 보느라 아예 숨통이 턱턱 막히니 말이다. 이것은 천민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역기능이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은 이익(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경쟁자들이며,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친지들의 만남은 ‘보상 없는 희생’을 강요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묻는 것이든, 명령하는 것이든 간에 안녕이라는 인사는 누군가를 만남을 전재로 한다. 앞서 말했듯이 가족처럼 접촉빈도가 높은 상대 일수록 분쟁・경쟁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은 분명하다. 요즘 시정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웃지 못 할 말이 회자 되듯 ‘만나지 않는 사람과 일 생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각설하고 만남이라는 입장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새롭게 새겨보자. 불교의 밀교에는 삼밀(三密)수행이 있다. 말・행동・생각 이 셋[三]을 부처님과 일치되는 경지에 이르게 하는 수행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전기가 선으로 흐르고 있을 때는 겉으로는 알아볼 수도, 보여줄 수도 없지만 전구에 닿아서 불이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밀(密)이라 한다.
따라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할 때 “나는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하며 마음을 전해보자는 것이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말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끝없이 좋은 마음을 보내면 언젠가는 주변(상대들)이 달라진다는 확신으로 실천하자. 왜냐하면 ①말을 생각하는 첫 번째 사람도 자기 자신이요, ②말을 하는 첫 번째 사람도 자기 자신이요, ③말을 듣는 첫 번째 사람도 자기 자신이다. 이것은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기 전에 첫 번째로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꼴이 된다. 이처럼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열린 마음이 가장먼저 자신의 행동과 말의 변화를 일으킴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로 시작되는 생각・말・행동이 일상의 모든 곳에서 실천될 때 그것이 복(福)이요, 행운이요, 행복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만남의 상대가 더 이상 분쟁과 경쟁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다. 특히 자신을 해코지 하려 드는 사람에게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요(凹)가 철(凸)을 만나 짝을 이루듯이 “나는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는 마음을 담은 ‘안녕하세요’가 요철(凹凸)로서 하나가 될 때까지 자신은 낮추고 낮추고 상대는 높이고 높이다 보면 결국 그 경지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다.